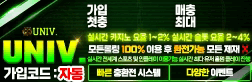예열용 짧야설) 매음굴에 팔려간 여자의 최후
-1일차
끄응…!
남자는 품에서 낡은 동전 몇 닢을 꺼내 탁자 위에 던져두고는, 미련 없이 방을 나섰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방 안에는 지독한 향냄새와 정액 냄새, 그리고 유아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하… 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다. 다리 사이에서는 방금 전 남자가 쏟아낸 것이 주르륵 흘러나오는 감각이 생생했다.
주르륵…
허벅지 안쪽을 타고 흘러내리는 축축하고 불쾌한 감촉에, 유아는 저도 모르게 손을 가져갔다. 손가락 끝에 닿은 것은 미끈거리고, 희고, 탁한 액체. 코끝으로 가져가자 비릿한 냄새가 확 끼쳐왔다.
이게… 뭐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팔려온다는 것의 의미를, 매음굴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 흔적을 남겨놓고 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씻어내면 그만인 더러움이 아니었다. 몸의 가장 깊은 곳을 침범당했다는, 지울 수 없는 증거였다.
“아… 아아…”
다리 사이에서 꾸역꾸역 밀려 나오는 정액을 보며, 유아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뱃속이 이상했다. 무언가 이물질이 들어와 있는 듯한 묵직함과, 미미한 온기. 그것이 남자의 씨앗이라는 사실이 현실감 없이 다가왔다.
-삼주일 차
철퍽! 철퍽!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눅눅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유아는 이제 이 소리가 익숙했다. 제 위에서 헐떡이는 남자의 무게도, 등 뒤에서 허벅지 안쪽을 더듬는 땀에 젖은 손길도, 그리고… 제 보지를 헤집는 뜨거운 자지의 감촉도.
“흐으… 큿…!”
남자의 손가락이 유아의 배를 꾹 눌렀다. 배꼽 아래, 자궁 바로 위쪽에 새로 새겨진 문신. 붉고 탐스러운 복숭아 그림과 그 아래 '최상급 씨받이’라는 글자. 남자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더욱 거세게 허리를 박아댔다.
“크으… 네년 보지는 진짜… 안에 씨를 뿌리고 싶게 만드는군… 문신대로야, 아주…”
남자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유아의 귓가에 속삭였다. 3주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유아의 몸은 빈틈없이 낙인으로 채워졌다.
가슴에는 유두를 감싸는 기괴한 꽃 문양이, 등에는 '육변기’라는 글자 외에도 몇 명의 남자가 이곳을 거쳐 갔는지 알 수 없는 정(正)자가 여러 개 새겨졌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 첫날 새겨졌던 바를 정(正)자는 이제 획으로 가득 차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아…! 흐읏…! 하으응…!♥”
싫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다. 클리토리스가 남자의 치골에 짓눌릴 때마다 짜릿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랐다. 질벽은 이미 수십 번의 정액으로 길들여져, 남자의 자지를 쫀득하게 물고 늘어졌다.
“싼다…! 네년 자궁에 듬뿍 싸주마…!”
남자가 외쳤다. 유아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비틀며 안쪽을 조였다.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남자의 자지는 더 깊숙이, 자궁 입구를 뭉개듯이 파고들었다.
꾸우우욱-!
“흐아아아앙…!!!♥♥”
뜨겁고 진득한 액체가 폭발하듯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뱃속이 순식간에 뜨거운 것으로 가득 차는 감각.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었지만, 이물감과 함께 찾아오는 미약한 포만감은 여전히 소름 끼치도록 낯설었다.
도퓻, 도퓻, 붓…!
남자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려는 듯 자지를 빼지 않고 부들부들 떨었다. 유아의 보지는 그의 정액을 받아내며 움찔, 움찔 경련했다.
“후우…”
잠시 후, 남자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자지를 뽑아냈다. 질퍽이는 소리와 함께, 희고 탁한 정액이 벌어진 보지 틈으로 울컥, 하고 흘러넘쳤다. 남자는 제 흔적으로 더러워진 유아의 다리 사이를 흘깃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갔다.
쾅.
또다시 혼자 남겨진 방. 유아는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리 사이에서는 방금 전 남자가 쏟아낸 정액이 미지근한 온기를 남긴 채 허벅지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닦아낼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어차피 닦아내도, 잠시 후면 다른 남자의 것으로 다시 더러워질 뿐이었다. 뱃속에 가득 찬 이 뜨거운 씨앗들이 마치 제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육 개월 차
“벌려봐라.”
차가운 명령이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유아는 기계적으로 다리를 벌렸다. 삐걱이는 침상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양쪽으로 활짝. 6개월 전이었다면 온몸을 떨며 거부했을,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자세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익숙한 행위였다.
수치심은, 닳고 닳아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님이 유아의 다리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매일같이 수십 명의 사내들이 드나드는 통로를 품평하는 날카로운 시선.
“흠.”
허벅지 안쪽을 가득 메운 바를 정(正)자는 이제 시커먼 먹물 덩어리로 보일 지경이었다. 배꼽 아래의 복숭아 문신은 잦은 마찰로 색이 희미하게 바래 있었다. 마님은 만족스럽지도, 불만스럽지도 않은 표정으로 유아의 보지를 내려다보았다. 쉴 새 없는 관계로 인해 살짝 부어오른 붉은 살점. 언제나 정액과 애액으로 미끌거리는 입구.
“안이 헐었는지 봐야겠다. 더 벌려.”
유아는 말없이 다리를 조금 더 벌렸다. 마님의 거친 손가락 두 개가 소음순을 난폭하게 헤집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질 안으로 쑥 들어왔다.
질꺽…
“흐읏…”
아주 희미한 신음이 새어 나왔다. 고통도, 쾌락도 아니었다. 그저 이물질이 들어왔다는 신체적인 반응일 뿐. 손가락이 안쪽을 휘저으며 질벽의 상태를 확인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은 자지들을 받아내어 흐물흐물해지지는 않았는지, 상처가 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자궁 입구는 아직 단단하군. 씨를 받기에는 최적의 상태야.”
마님은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자궁경부를 꾹꾹 눌렀다. 아랫배 깊숙한 곳이 욱신거렸다. 매일 밤마다 뜨거운 정액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로 그곳이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텅 비어버린 그릇이 된 기분이었다. 누군가의 씨앗을 담기 위해 존재하는, 그저 구멍 뚫린 고깃덩어리.
질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님이 손가락을 빼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유아의 애액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마님은 그 손가락을 제 코앞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다.
“비린내는 나지 않는군. 좋아. 오늘은 손님이 많을 게다. 단단히 준비해둬라.”
그 말을 남기고 마님은 몸을 돌렸다. 유아는 다리를 벌린 자세 그대로, 텅 빈 눈으로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았다. 곧 이 방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와, 이 비어버린 그릇을 채우고 갈 터였다.
-이 년차
삐걱.
낡은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육중한 발소리.
유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사지는 차갑고 뒤틀린 형상의 나무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손목과 발목은 두꺼운 쇠고랑으로 기둥에 박혀 있었고, 몸은 엉덩이만 높이 치켜든 자세로 완벽하게 굳어 있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눈꺼풀과 혀, 그리고 아주 약간의 허리뿐이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시간의 감각도, 낮과 밤의 구분도 무의미했다. 그녀의 세계는 눈앞의 곰팡이 핀 나무 벽과, 제 몸에 뚫린 세 개의 구멍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
방에 들어온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익숙하게 제 바지를 내리고, 단단하게 발기한 자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나무틀에 고정된 유아의 엉덩이 사이로 다가왔다. 언제나 정액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는 보지 입구. 남자는 아무런 애무도, 준비도 없이 그곳에 제 귀두를 가져다 댔다.
꾸욱.
“흐읏…”
반사적인 신음이 목구멍에서 새어 나왔다. 거대한 자지가 질 입구를 비집고 들어오는 감각.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천, 수만 번을 받아들였지만, 첫 삽입의 감각은 여전히 낯설었다.
질꺽, 찌걱…
남자는 유아의 허리를 붙잡고 기계적으로 허리를 찧기 시작했다. 유아의 몸은 그저 나무틀에 매달린 채, 남자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릴 뿐이었다. 쾌감은 없었다. 그저 단단한 살덩이가 안쪽을 헤집고 다니는 이물감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몸은, 끔찍하게도 정직했다.
“하으… 아…♥”
질벽이 반사적으로 수축하며 자지를 물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애액이 흘러나와 남자의 움직임을 더욱 매끄럽게 만들었다. 뇌는 죽어버렸지만, 몸은 이미 완벽한 암컷으로 조교되어 있었다.
퍽! 퍽! 퍽!
남자의 움직임이 거칠어졌다. 그의 신음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유아는 텅 빈 눈으로 앞을 바라보며, 이 행위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크읏…! 싼다…!”
남자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유아의 허리를 으스러져라 붙잡고, 자지를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 넣었다. 자궁 입구가 단단한 귀두에 뭉개지는 감각.
꾸우우우욱-!
“흐아아앙…!♥♥”
뜨겁고 진득한 정액이 마치 폭포수처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뱃속이 순식간에 묵직하게 차오르는 감각. 남자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자궁구에 직접 쏟아붓고는, 부들부들 떨며 절정의 여운을 즐겼다.
질퍽…
잠시 후, 힘이 빠진 자지가 질에서 빠져나갔다. 남자는 뒤처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을 나갔다. 쾅, 하고 문이 닫혔다.
유아는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였다. 벌어진 보지에서는 방금 전 남자가 쏟아낸 정액이 하얀 줄기를 이루며 주르륵 흘러내려, 아래에 놓인 더러운 천 위로 뚝뚝 떨어졌다. 뱃속의 뜨거웠던 씨앗이, 밖으로 흘러나오며 차갑게 식어가는 감각만이 선명했다.
Comments